program
piano concerto no.1 in f#minor, op.1
피아노협주곡 1번 올림 바단조, 작품번호 1
piano concerto no.2 in c minor, op.18
피아노 협주곡 2번 다단조, 작품번호 18
-intermission-
piano concerto no.3 in d minor, op.30
피아노 협주곡 3번 라단조, 작품번호 30
-intermission-
piano concerto no.4 in g minor, op.40
피아노 협주곡 4번 사단조, 작품번호 40
rhapsody on a theme of paganini, op.43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광시곡, 작품번호 43


롯데콘서트홀은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야한다.
요즘은 인포메이션에 사람이 앉아 있는 대신 기계가 여기저기 놓여 있다. 하지만 평생을 인포메이션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고 다녔던 나같은 사람에게 기계로 나오는 안내는 없는거나 마찬가지다.
롯데 콘서트홀의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야한다는 사실을 몰라 헤맸던 경험은 나만 있는 걸까.
아무튼 조금 촉박하게 도착하는 바람에 1층과 7층에 있는 엔제리너스에서 커피도 한 잔 못사먹고 바로 들어가야했다.


내 전화기가 너무 늦게 켜져서 커튼콜때 사진을 제대로 찍지 못한게 너무 아쉽다.
비행기 모드로 해놓고 봤어야 했나
커튼콜때 사진을 찍고 싶은데 전화기가 늦게 켜지면 늘 갈등이 된다.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녀가 어릴때 피아노 학원을 꼭 한 번은 보내지 않나 싶을 정도로 피아노 학원에 안다녀본 친구가 주변에 드믈고 지금 내가 부모가 되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상황에서는 주변에 아이에게 피아노를 전혀 가르쳐보지 않은 친구가 없다.
짧게는 두 달부터 길게는 십수년까지. 언제부턴가 필수적인 코스처럼 된 피아노.
그런 영향일까. 난 그냥 오케스트라보다는 피아노 협주곡을 더 좋아한다. 내가 유일하게 아는 악기이기 때문이다.
불혹을 훌쩍 넘기고 남편과 함께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한 입장에서는 더더욱 피아노에 애정이 남다르다.
그런데 이게 참 재미있다.
모짜르트 곡을 연주하는 공연을 보고 오면 목표가 모짜르트가 되었다가
히사이시 조 공연을 보고 오면 목표가 히사이시 조
그리고 라흐마니노프를 보고 와서는... 목표가... 아... 하지만 뭐랄까. 모짜르트나 히사이시조는 나같은 사람이 목표로 삼을만 했다면 라흐마니노프는.... 이건 안되겠는데. 하는 생각이 절로 든다.
일리야 라쉬코프스키 공연이 3시간인지 모르고 갔다가 3시간이나 되어서 정말 깜짝 놀랐다.
3시간 동안 피아노를 친다고? 그게 가능한가?
중간 중간 피아노가 쉬는 타임도 있지만.... 이건 정말 광고에서 본 것처럼 일리야 라쉬코프스키의 무한한 도전이라는 표현이 딱 맞다.
혼자서 연습을 3시간 하는건 어렵지 않겠지만
나같이 취미로 피아노를 하는 사람과는 당연히 하늘과 땅 차이겠지만 나같은 경우엔 30분동안 레슨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 선생님 앞에서 30분이나 피아노를 치고나니 하루치 에너지를 다 써버린 느낌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수백명의 관객 앞에서
오케스트라와 호흡을 맞춰가며
3시간이나 피아노를 쳐야한다니.
뭐 일단 그런 긴장감, 고단함은 내 것이 아니니
난 나대로 관객으로서의 긴장감을 추스르며 자리를 잡았다. 50명이 넘는 악사들이 연주를 하는 동안
내가 재채기라도 하지 않을까.
기침이 나오면 어쩌지.
콧물이 나면?
갑자기 발바닥이 간지러우면?
언젠가 벨크로가 있는 구두를 신고 연주회에 갔다가 무대 바로 앞 3번째 줄에 앉아 연주를 듣게 되었는데 발바닥이 간지러워서 괴로웠던 일이 실제로 있어서....
발바닥은 간지러운데 벨크로를 뜯는 소리가 날까봐 어쩌지도 못하고 그러다보니 발바닥은 미칠듯이 간지럽고 결국 음악에 집중도 하지 못했던.
그렇게 악사들도 관객들도 숨 막히는 긴장을 견디며 첫번째 연주가 시작되었다.
아침일찍부터 바쁘게 보내서 같이 간 친구와 서로가 졸더라도 양해해주기로 했는데
오~ 3시간 내내 단 한 순간도 졸리지 않았다.
라흐마니노프는 내가 엄두도 내지 못하는 곡이었던 탓에 평소 잘 듣던 곡이 아닌데도 50여명의 악사들과 일리야 라쉬코프스키. 그리고 정말 근사했던 지휘자. 그들의 완벽한 호흡으로 자연스럽게 곡의 흐름에 내 온 신경이 같이 흘러다니는 느낌이었다.
집에서 그냥 시디만 크게 들어도 좋은데
이걸 내 바로 앞에서 실제 악기로 연주하니 이건 정말 귀로 듣는 걸 넘어서 온 몸으로 음악이 스며들어와서 날 이리저리로 데리고 다니는 기분이었다.
오늘 하루.
이른 아침부터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동네 도서관에 없어서 멀리 있는 도서관에 신청해둔 책을 빌리고 버스를 두 번이나 갈아타면서 모임 장소로 이동하고 모임을 마치고는 다른 도서관으로 가서 이미 3주나 연체된 책을 반납하고 3시에서야 늦은 점심을 먹고 아이를 데리고 오고 저녁을 챙겨주고 이곳에 오기까지의 내 고단했던 하루가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미화되고 내 하루가 아름답게 느껴지니 내가 귀한 사람이 된 느낌.
언젠가 엄마랑 단둘이 오케스트라 연주를 보게 된 일이 있는데 난 연주가 시작되고 10분이나 지났을까 바로 잠이 들어버렸는데 졸면서도 중간중간에 깨서 엄마를 봤는데 일생 서양 클래식과는 거리가 멀게 살아온 엄마가 연주에 몰입해서 눈을 빛내며 듣고 계신걸 보고는 놀랐던 일이 있다.
그리고 라흐마니노프를 잘 모르면서도 이렇게 졸지 않고 연주에 집중한 나와 그때의 엄마가 오버랩 됐다.
원래 고전은 불혹을 넘겨야 들리나?
고전 명작 소설도 어느정도 인생을 살아본 후에 읽어야 이해가 된다더니. 그런걸까?
아 그것도 아니다. 내 바로 앞엔 어린 남자애 둘이 와서 앉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뒤통수만 봐도 그 소년들은 감격한것 것 같았다.

앵콜은 없었지만 완전히 이해한다. 3시간이면 충분하지.
모처럼의 아름다운 공연으로 행복한 시간을 보내서일까.
이틀이나 지난 지금도 라흐마니노프를 듣고 있다. 공연실황도 아니고 느낌도 크게 다르지만 같은 멜로디가 공연에서 느꼈던 감동을 재연해준다.
더해서 탬버린과 트라이앵글이 그런 악기였나? 탬버린과 트라이앵글의 재발견이다(그나저나 거기서 나온 악기도 이름이 같을까. 뭔가 더 근사한 다른 이름이 있는건 아닐까. )
요즘은 영화 한편 보려해도 2만원인데.
오케스트라 공연을 자주 안봐서 그런걸 수도 있겠지만 난 내 인생 통털어 오케스트라 공연을 봤던 순간들, 같이 간 사람들을 모두 기억한다.
그러니까 가성비만 따져보아도 오케스트라 공연이 더 이익이 아닌가 하는 얕은 계산을 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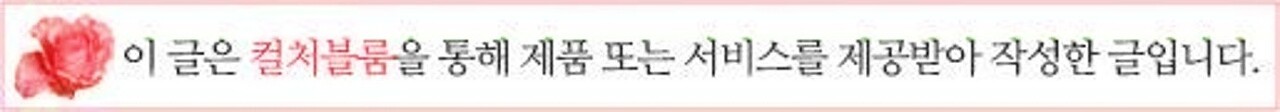
'기타 리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드래곤 하이 :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 (1) | 2023.09.09 |
|---|---|
| 스타벅스 가방 (0) | 2023.09.09 |
| 드래곤 하이-국립중앙박물관 용 (0) | 2023.08.26 |
| 일리야 밀스타인: 추석 연휴 갈만한곳 추천 (0) | 2023.08.26 |
| 뮤지컬 : 이상한 엄마 (0) | 2023.08.20 |